지구의 장기적인 지질학적 시간 동안에 비춰 광범위한 화산 사슬이 화산 분출 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지표면의 온도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23일 네이처 지구과학 발표에 따르면 영국 사우샘프턴대 과학자들이 이끄는 호주 시드니대, 호주 국립대, 캐나다 오타와대, 영국 리즈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난 4억년간 지구의 육지와 바다 및 대기에 미친 화산 폭발의 영향을 분석했다.
화산 분출 때문에 대기 중에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제거되는 과정은 지표면에서 암석이 저절로 분해 용해되는 화학적 풍화작용(chemical weathering)을 거치게 된다. 풍화의 산물인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미네랄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피드백 메커니즘이 지질학상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 기후도 조절한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화산 사슬이 화산 분출 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해 지표면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17년 남미 페루에서 분출한 사반카야 화산. © Wiki Commons / Galeria del Ministerio de Defensadel Pe브
논문 제1저자인 사우샘프턴대 지구과학과 톰 거넌 부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구 표면의 풍화는 지질학적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통제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구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호주 국립대 대양기후변화학과 엘코 롤링 교수는 지구과학적인 여러 과정이 서로 연결돼 있으며 과정과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따라서 지구시스템이 나타내는 반응 가운데 특정 과정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구시스템 속 인터랙션화 연구
이런 복잡성을 풀기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판구조 재구성을 통합한 새로운 지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구 시스템 내에서 지배적인 상호작용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식별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대륙에 즐비한 화산(화산호volcanicarcs)이 지난 4억 년 동안 풍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대륙의 화산호는 남미 안데스 산맥과 미국 서부의 산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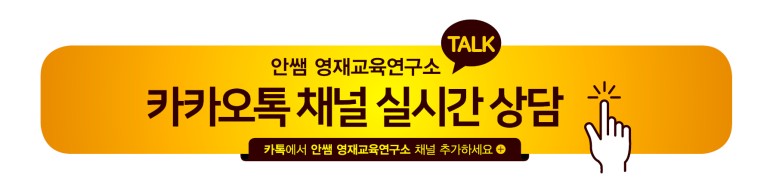
줄지어 있는 대륙의 화산들은 빠른 속도로 풍화하여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러시아 캄차카 지방의 화산이 연결된 산맥(화산호). © Tom Gernon, University of Southampton
이들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먼저 침식되는 지형에 속한다. 화산암은 파편화되어 화학적으로 잘 반응하기 때문에 빨리 풍화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사우샘프턴대 지구화학과 마틴 팔머 교수는 이들 현상은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라며 이들 화산은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분출해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켰지만 한편으로는 급속한 풍화반응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바위가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흙이 되는 풍화작용에서는 물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생물학적 유기체의 활동도 중요하다.
인공풍화 계획의 설계와 평가에 도움이 된다.
이번 연구는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친 지구 기후의 안전성은 해저와 대륙 내부의 균형을 반영한다는 오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논 교수는 대륙과 해저 간의 지질학적 줄다리기가 지구 표면풍화의 지배적 동인이라는 생각은 데이터에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분석 결과는 자연이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오늘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수준은 과거 300만 년 중 어느 때보다 높고,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화산 배출량보다 약 150배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4억 년 동안 전 지구적 화학적 풍화작용은 화산호(volcanic arcs)에 의해 주도됐다. 풍화의 산물인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은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미네랄을 형성한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바케닝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강물 © Tom Gernon, University of Southampton
오랜 옛날 지구를 구한 것처럼 보이는 대륙의 화산은 오늘날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의 발견은 우리 사회가 현재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화학반응률을 높이기 위해 암석을 분쇄해 지상에 퍼뜨리는 인위적인 강화암석 풍화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대륙의 연속된 화산환경에서나 볼 수 있는 칼슘과 칼륨 및 나트륨을 포함한 칼슘-알칼리성 화산물질을 사용해 최적 배치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보고 있다.
가논 교수는 “이 방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경감경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긴급히 완전하게 감축해야 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오랜 기간 풍화피드백에 대한 이번 평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인 대규모 강화된 풍화계획(enhanced weatherings)의 평가다.
출처 >>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99%94%ec%82%b0-%ed%8f%ad%eb%b0%9c%ec%9d%b4-%ec%9e%a5%ea%b8%b0%ec%a0%81%ec%9c%bc%eb%a1%9c-%ec%a7%80%ea%b5%ac-%ea%b8%b0%ed%9b%84-%ec%95%88%ec%a0%84%ed%8c%90-%ec%97%ad%ed%95%a0%ed%96%88/

